계약 없는 업무 요구, 일방적 계약 변경 등
어려움 속출.. “배달·운전↑·가사·돌봄 등↓”
지난해 한 달 145만 2,000원 수입, 전년比↓
월 14.4일·일 6.2시간 “부업형·간헐 근무↑”

배달이나 대리기사 등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감을 받아 돈을 버는 ‘플랫폼 종사자’ 규모가 지난해만 전년 대비 11.1% 늘어난 88만 3,000명으로, 해를 거듭해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지속 늘 것만 같던 배달·운전 분야 종사자는 줄고 정보기술(IT) 서비스·전문 서비스 분야가 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 변화와 함께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많은 수입과 일의 자유도를 감안해 시장에 뛰어 들었지만, 정작 기대 이상 소득 창출엔 한계를 겪었습니다. 한 달 평균 150만 원을 벌지 못했습니다. 주 소득원을 플랫폼 노동에 의존하는 ‘주업형’보다 ‘부업’이나 가끔 일하는 방식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4명 중 1명 꼴이던 여성 비중은 3명 중 1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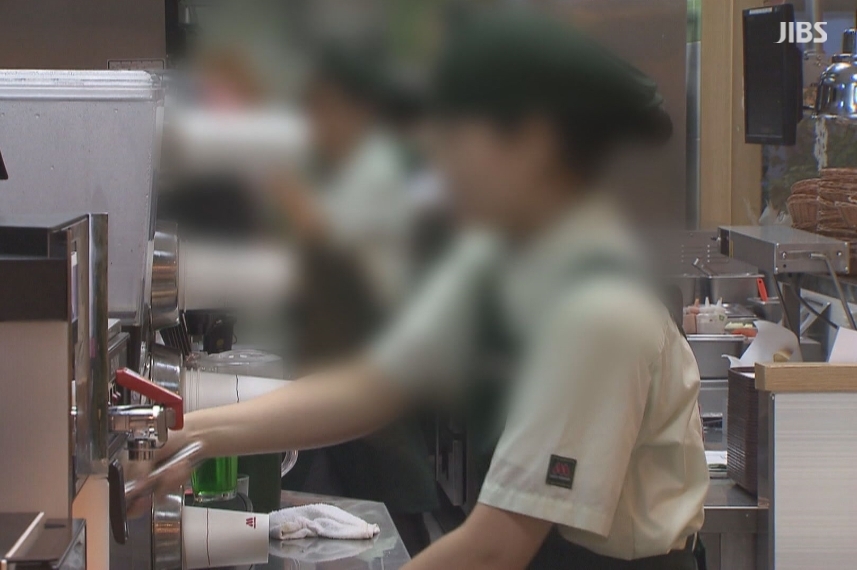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88만 3,000명으로 2022년 79만 5,000명 대비 11.1%(8만 8,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디지털 기술 등 발달과 함께 플랫폼 자체가 늘고, 보다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면서 플랫폼 종사자 수는 지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배달·운전’이 48만 5,000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상담 등 ‘전문 서비스’ 14만 4,000명, 데이터 입력 등 ‘컴퓨터 단순 작업’이 8만 7,000명, ‘가사·돌봄’ 5만 2,000명, 디자인 등 ‘창작활동’ 5만 명, ‘정보기술(IT) 서비스’ 4만 1,000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정보기술(IT) 서비스’(141.2%)와 ‘전문 서비스’(69.4%) 분야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게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배달·운전’(-5.5%) 분야는 전과 달리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 종료로 인해 배달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합니다.
또 맞벌이 확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사·돌봄’(-1.9%) 분야 종사자도 줄었습니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시장에 적정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성별은 여성 비율이 29.6%(26만 1,000명)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2022년 25.8%(20만 5,000명) 보다는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30대(28.7%), 40대(26.9%), 50대(20.2%), 20대(13.8%) 순이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주업형’ 비율은 줄고 ‘부업’이나 간헐적 ‘참가형’이 소폭 늘어난 것도 수입 구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플랫폼 종사자 중에 ‘주업형’이 2022년에 비해 다소 감소(57.7→55.6%)했지만 ‘부업형’(21.1→21.8%)이나 간헐적인 ‘참가형’(21.2→22.6%)은 늘었습니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개인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 종사일 수(14.7일→14.4일)와 시간(일 6.4시간→일 6.2시간)은 다소 줄었습니다.
플랫폼 일자리를 통한 수입도 월 평균 145만 2,000원으로 2022년보다 1만 2,000원 감소했습니다. 시간이나 ‘주업형’ 비율 감소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들은 평균 ‘한 달에 14.4일’, ‘하루 6.2시간’을 일하면서 ‘월 145만2,000원’을 벌었습니다. 전년 대비 일한 시간이나 월급 수준이 모두 줄었는데, 그만큼 주업형 종사자보다는 부업이나, 가끔 일하는(간헐적) 패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하면서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 ‘건강·안전의 위험·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등으로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때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9.7%), 보수 지급이 지연되는 것(9.5%) 역시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려움 속출.. “배달·운전↑·가사·돌봄 등↓”
지난해 한 달 145만 2,000원 수입, 전년比↓
월 14.4일·일 6.2시간 “부업형·간헐 근무↑”

배달이나 대리기사 등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감을 받아 돈을 버는 ‘플랫폼 종사자’ 규모가 지난해만 전년 대비 11.1% 늘어난 88만 3,000명으로, 해를 거듭해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지속 늘 것만 같던 배달·운전 분야 종사자는 줄고 정보기술(IT) 서비스·전문 서비스 분야가 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 변화와 함께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많은 수입과 일의 자유도를 감안해 시장에 뛰어 들었지만, 정작 기대 이상 소득 창출엔 한계를 겪었습니다. 한 달 평균 150만 원을 벌지 못했습니다. 주 소득원을 플랫폼 노동에 의존하는 ‘주업형’보다 ‘부업’이나 가끔 일하는 방식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4명 중 1명 꼴이던 여성 비중은 3명 중 1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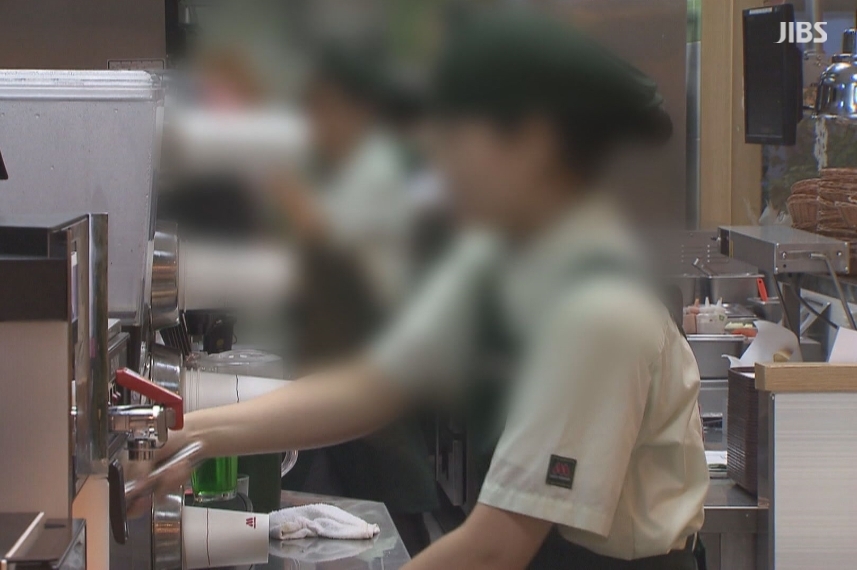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88만 3,000명으로 2022년 79만 5,000명 대비 11.1%(8만 8,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디지털 기술 등 발달과 함께 플랫폼 자체가 늘고, 보다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면서 플랫폼 종사자 수는 지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배달·운전’이 48만 5,000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상담 등 ‘전문 서비스’ 14만 4,000명, 데이터 입력 등 ‘컴퓨터 단순 작업’이 8만 7,000명, ‘가사·돌봄’ 5만 2,000명, 디자인 등 ‘창작활동’ 5만 명, ‘정보기술(IT) 서비스’ 4만 1,000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정보기술(IT) 서비스’(141.2%)와 ‘전문 서비스’(69.4%) 분야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게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배달·운전’(-5.5%) 분야는 전과 달리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 종료로 인해 배달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합니다.
또 맞벌이 확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사·돌봄’(-1.9%) 분야 종사자도 줄었습니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시장에 적정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성별은 여성 비율이 29.6%(26만 1,000명)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2022년 25.8%(20만 5,000명) 보다는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30대(28.7%), 40대(26.9%), 50대(20.2%), 20대(13.8%) 순이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주업형’ 비율은 줄고 ‘부업’이나 간헐적 ‘참가형’이 소폭 늘어난 것도 수입 구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플랫폼 종사자 중에 ‘주업형’이 2022년에 비해 다소 감소(57.7→55.6%)했지만 ‘부업형’(21.1→21.8%)이나 간헐적인 ‘참가형’(21.2→22.6%)은 늘었습니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개인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 종사일 수(14.7일→14.4일)와 시간(일 6.4시간→일 6.2시간)은 다소 줄었습니다.
플랫폼 일자리를 통한 수입도 월 평균 145만 2,000원으로 2022년보다 1만 2,000원 감소했습니다. 시간이나 ‘주업형’ 비율 감소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들은 평균 ‘한 달에 14.4일’, ‘하루 6.2시간’을 일하면서 ‘월 145만2,000원’을 벌었습니다. 전년 대비 일한 시간이나 월급 수준이 모두 줄었는데, 그만큼 주업형 종사자보다는 부업이나, 가끔 일하는(간헐적) 패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하면서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 ‘건강·안전의 위험·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등으로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때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9.7%), 보수 지급이 지연되는 것(9.5%) 역시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