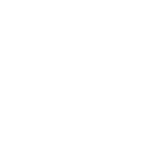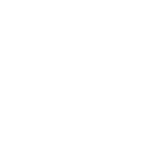제주, 4·3 기획, 5. '한라산 피난' 역사 조사 시급
(앵커)
JIBS는 올해 4·3 73주년을 맞아 4·3 당시 피난민들의 피신처와 군경 주둔소 등을 집중 보도해 드렸습니다.
당시 피난처와 주둔소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건, 4·3 당시 실상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라산 등 제주 산간 지역의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50년대 말쯤 한라산 '종남궤' 부근에서 소를 키우던 강상흥 할아버지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강상흥 할아버지(81세)/서귀포시 하원동
(인터뷰)-(자막)-"소 찾으러 다니면서 완전한 시신을 본 것은...우비같은 것에 완전히 덮혀서..."
60년대쯤에는 윗세오름 부근에서 사람 두개골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강상흥 할아버지(81세)/서귀포시 하원동
(인터뷰)-(자막)-"해골만 저 윗세오름 제일 서쪽 오름 앞에서 길 옆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강 할아버지가 지목한 곳은 해발 1천1백미터 부근인 볼레오름보다 각각 1백여미터, 6백여미터나 높은 곳입니다.
4·3 당시 한라산 피난민들의 피신했을 것으로 알려졌던 볼레오름보다 휠씬 높은 곳까지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한라산 곳곳에선 4·3 피난민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집터도 발견됩니다.
김동은 기자
(S/U)"4·3 당시 수많은 주민들이 한라산으로 피신해 왔지만, 한라산에 대한 정확한 연구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3 진상조사가 해안가 마을 집단 학살 등 피해 조사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한라산 일대 4·3 피난민에 대한 조사와 연구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김은희 제주 4·3 연구소 연구실장
(인터뷰)-(자막)-"지금까지는 해안에서 중산간 일대 중심으로 조사가 됐다면, 여기(한라산)는 아예 그림자인 거죠. 한라산 지역은 아직까지 뿌연 그림자 상태에요"
4·3 당시 한라산 피난과 토벌 작전 실태 조사가 시급한 건 직접 토벌작전에 참가하거나, 유해를 목격한 증언자들이 고령이라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복순 할머니(91세)/서귀포시 표선면
(인터뷰)-(자막)-"고사리 꺾으러 굽은돌장(지형명)에 가서 보면 시체가 있었다. 사람 죽은 시체가...그냥 이런 담 옆에도 있고, 저 넓은 곳에서 엎어져서 죽고..."
게다가 한라산 일대에 예전 지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조사 연구를 할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상봉 한라산 인문학 연구가
(인터뷰)-(자막)-"한라산의 궤나 지역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다는 것, 또 그 당시 피난민들이, 왔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서 그것을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라산과 중산간 일대 피난처와 군경 주둔소 같은 4·3의 핵심 증거들이 70년이 넘는 시간 속에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박찬식 전 제주4·3연구소장
(인터뷰)-(자막)-"농지로 개간되면서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제라도 군경 주둔소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더불어서 문화재 지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949년 3월 토벌대가 한라산에서 내려오면 살려주겠다고 하자, 백기를 들고 하산한 피난민만 무려 만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불법 군법회의에 넘겨져 사형당하거나 형무소로 보내졌고 목숨을 잃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아직도 한라산에서 베어 있는 4.·3 당시 죽음의 피난과 토벌의 역사를 정확히 밝혀내는 게, 제주 4·3 진상 규명의 가장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